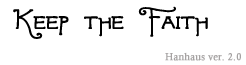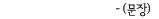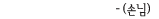글 수 223

볼펜으로 쿡쿡 눌러쓴 육필 편지.
겉봉투에 우표가 붙어 날라온
진짜 편지를 받아보신 적이 최근에 있으신지요.
제게 오는 것은 온통 이메일뿐이고 그마저 스팸이 절반을 넘습니다.
봉투로 오는 것은 상품안내장 대출홍보우편 모임안내 따위 뿐입니다.
그 옛날처럼 가슴 떨리게하는 진짜 편지 한번 받아 보고 싶습니다.
전광석화같은 빠른 스피드에 변화가 변화를 밀어붙이는 세상입니다.
파악하기도 어려운 디지털 문명이 형형색색 신제품으로 둔갑해
눈과 귀를 진동시키고 홀립니다.
디지털은 무한 용량과 무한대의 변신능력으로 우릴 바짝 조입니다.
매스컴이 전하는 세상 소식도 신제품처럼 언제나 반짝반짝 해야 합니다.
어제의 소식은 순식간에 밀려나 유통기한 만료로 취급됩니다.
말끔한 포장과 감각적인 헤드라인으로 무장한 새로운 뉴스만이
수용자에게 즉각 소비됩니다.
오늘은 독자 여러분께
디지털한 것들의 야단법석과 정반대되는
'아날로그' 를 보여드리려 합니다.
아날로그는 호화찬란하지 않으며 대개 케케묵은 것들입니다.
존재는 아날로그 상태로 우연과 필연을 엮어가면서 생명력을 유지합니다.
팍팍한 인생, 잘 풀리지 않는 살림살이, 공짜나 에누리 없는 현실...
오늘은 그 누구도 두 발을 뗄 수 없는 아날로그적 세상살이에 대해
운을 떼볼까 합니다.
'칼의 노래' '현의 노래'의 작가 김훈은
이 시대 대표적인 아날로그스타일 작가입니다.
아직도 글을 쓸 때면 원고지뭉치와 연필과 지우개를 들고 덤빕니다.
그가 구사하는 문체는 관념적이지 않습니다.
추상성를 극도로 배제한 단정적 아날로그 스타일입니다.
가쁜 호흡에 땀 냄새가 밴 직관의 글밭들 입니다
글 작업이 마무리되면
두 손은 연필 흔적과 지우개로 말미암아 시커멓다고 합니다.
대형서점에서 열리는 '작가와의 만남'때 작가는
그의 팬들에게 쓰다 남은 몽당연필을 선물합니다.
'영혼의 손때' 묻은 몽당연필을 친애하는 독자께 선물하는 것,
역시 그 답습니다.
김훈은 자신의 에세이에서 자신은 몸으로 느낀 것만을 쓴다고 말합니다.
떨리는 질감으로 표현되는 언어만이 진실을 전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사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교감의 방식'이란
원천적으로 아날로그적일 수 밖에 없음을 그는 강조합니다.
김훈 世說 두번째 < 밥벌이의 지겨움 >
( 2005 개정판, 생각의 나무)에서
그의 아날로그적 에세이 몇몇 조각을 발췌 편집하였습니다.
# 내 발다닥의 굳은 살
개를 데리고 산보를 할 때,
나는 개 다리의 움직임에서 아날로그적 삶의 기쁨을 느낀다.
내 콧구멍에서 김이 날때 , 개 콧구멍에서도 김이 난다.
나는 사람이나 개의 몸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신뢰할수 있는 부분은
발바닥의 굳은 살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개의 발바닥이나, 두 갈래로 갈라진 돼지 발바닥,
소 발바닥을 들여다 볼 때마다
그 존재들의 개별적 삶의 역사를 생각하면서 목이 멘다.
망치로 못을 칠 때도 못대가리를 수직으로 내리찍어야 한다.
이 수직의 각도가 어긋나면 못은 똑바로 박히지 않는다.
망치로 못대가리를 때려서 차츰 나무속으로 밀어넣을 때,
나무의 여러 질감들이 내 몸속에 와서 내 몸의 일부가 된다.
바싹 마른 나무에 못을 박을 때는 위태롭다.
나는 그렇게 해서 나무를 이해하게 된다.
이 이해는 분석되거나 재구성되지 않는다.
망치로 못을 박는 순간에만 이 이해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
못 박기를 끝내면 이 이해의 기쁨은 소멸한다.
그래서 못을 박는 일은 악기를 연주하는 일과 같다.
그러니 못이 휠 때 내가 느끼는 부끄러움은 크다.
못대가리가 휠 때마다 세상과의 교감에 이토록 서툰,
내 생명의 초라함에 문득 놀란다.
아날로그 세상의 슬픔과 기쁨은 등불처럼 환하다.
한그릇의 음식도 완전한 아날로그적 방식으로만 이 세상에 태어난다.
나는 음식을 만드는 사람들의 착한 마음과 그 놀라운 상상력을 사랑한다.
음식은 재료와 재료 사이의 교감으로 태어난다.
된장찌게는 하나의 완벽한 새로운 세계다.
소파에 앉아서 부엌에 된장찌게가 끓는 소리를 들을 때
나는 내가 알지 못하는 세계에서 끓고 있는
된장찌게로 부터 소외되지 않는다.
나는 내 몸 속에서,
불과 물과 찌게 재료들의 밀고 당김을 받아들일 수 있다.
여자 사랑하기를 좋아하는 내 바람둥이 친구는
"연애란 오직 살을 부비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
나는 그의 말에 반박하지 못했다.
아, 저렇게 간단한 것을 몰라서 이토록 헤매었단 말인가 싶었다.
살은 오직 아날로그 방식으로만 작동한다.
살의 아날로그는 언어와는 무관한 것 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래서 언어의 반대말은 '살'이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다.
모르기는 해도, 살 역시
악기나 연장의 작동 원리와 다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두려운 것은 이 '살'이
타인의 '살'과의 관계속에서 작동한다는 것이다.
공사중인 집의 처마 끝에 매달려 못질을 하는 젊은 목수는
그 아름다움으로 나를 주눅들게 한다.
그러나 누구의 삶인들 고달프고 스산하지 않겠는가....
# 밥벌이의 지겨움
전기밥통 속에서 밥이 익어가는 그 평화롭고 비린 향기에
나는 한평생 목이 메였다.
이 비애가 가족들을 한 울타리 안으로 불러 모으고
사람들을 거리로 내몰아 밥을 벌게 한다.
밥에는 대책이 없다.
한두 끼를 먹어서 되는 일이 아니라 죽는 날까지 때가 되면
반드시 먹어야 한다.
이것이 밥이다.
이것이 진저리나는 밥이라는 것이다.
밥벌이도 힘들지만, 벌어놓은 밥을 넘기기도 그에 못지않게 힘들다.
술이 덜 깬 아침에, 골은 깨어지고 속은 뒤집히는데,
다시 거리로 나아가기 위해 김나는 밥을 마주하고 있으면
밥의 슬픔은 절정을 이룬다.
이것을 넘겨야 다시 이것을 벌 수 가 있는데,
속이 쓰려서 이 것을 넘길 수가 없다.
모든 밥에는 낚싯바늘이 들어 있다.
밥을 삼킬 때 우리는 낚싯바늘을 함께 삼킨다.
그래서 아가미가 꿰어져서 밥 쪽으로 끌려간다.
저쪽 물가에 낚싯대를 들고 앉아서
나를 건져 올리는 자는 대체 누군인가.
그 자는 바로 나다.
이 세상의 근로감독관들아,
제발 인간을 향해서 열심히 일하라고 조져대지 말아 달라.
제발 이제는 좀 쉬라고 말해 달라. 이미 곤죽이 되도록 열심히 일했다.
나는 밥벌이를 지겨워하는 모든 사람들의 친구가 되고 싶다.
밥벌이에는 아무 대책이 없다.
그러나 우리들의 목표는 끝끝내 밥벌이가 아니다.
이걸 잊지 말고 또다시 각자 핸드폰을 차고 거리로 나가서
꾸역꾸역 밥을 먹자.
무슨 도리가 있겠는가.
아무 도리가 없다.
# 그만큼 버려야 전압이 발생한다
0... 경찰기자로 다시 현장에 나와보니 삶의 바닥은 지극히 난해한 것이라는 사실을 실감한다. 수많은 욕망과 생각의 차이들이 뒤섞여 있는 것이 삶의 현장이다. 무수한 측면과 측면들이 저마다 정의라고 주장한다. 점점 판단을 정립하기가 어렵다. 어느 쪽이 옳고 그르냐는 근원적인 문제보다 존중과 타협이 중요하다. 그 어느 것도 절대 선이라고 주장할 수 가 없고, 절대 악으로 반박될 수가 없는 나름의 사연과 치열함이 현장을 복잡하게 만든다.
0... 내가 생각하는 기자의 본질은 첩보원 같은 거다. 많은 정보를 논리적으로 배열하는 게 본업이다. 팩트없는 사람은 수사학에 의존한다. 그런데 팩트의 취사선택은 기자 개인의 판단이다. 결국 주관과 객관의 문제인데... 그건 해결이 안된다. 기사의 객관성이 6하 원칙이라는 형식인데 그 자체는 맞는 얘기다. 그러나 진실을 담아내기엔 턱없이 부족한 그릇이다. 그걸 넘어서려는 새로운 글쓰기를 시도하는 것은 고통스런 실험이다.
6하의 존엄을 저버리지 않으면서 넘어서려는 것...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다. 스트레이트 문장은 깔금하다. 사실에 바탕을 둔 점 그리고 긴장감이 매력이다. 그러나 그것이 진실을 다 전할 수는 없는 것이다. 반대로 문학기사는 사실보다 기자의 직관이 끌고 가지만 사실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다. 훌륭한 직관은 진실에 근접한다. 문학담당 할때 나는 평론가나 저자 인용을 거의 안했다. 그냥 꼼꼼하게 읽어보고 썼다. 인용이 객관성을 담보한다는 발상은 지극히 위험한 생각이다.
0... 내 문장은 내면에서 올라오는 필연성이다. 나는 글을 쓸때 어떤 전압에 끌린다. 전압이 높은 문장이 좋다. 전압을 얻으려면 상당히 많은 축적이 필요하다. 또 그만큼 버려야 한다. 버리는 과정에서 전압이 발생한다. 안 버리면 전압이 생길 수 없다. 거대담론을 이해할 수 있었던 적이 거의 없다. 몸이 검증 안 한 언어를 쓸 수는 없는 것이다.
나는 기본적으로 사회적, 역사적 이런 말들이 잘 안 와 닿는다. 언어를 사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쓸 수는 없다. 내가 쓸 수 있는 언어는 한 줌밖에 안된다. 나이가 들수록 쓸 수 있는 언어는 점점 적어진다.
2005-11-25 , 동아일보 김용길 기자
harris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