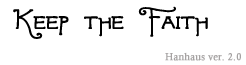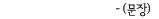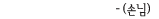글 수 223
지난주 정부는 ‘서비스 산업 선진화’라는 거창한 이름으로 파견노동자를 허용하는 업무를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래야 일자리도 늘고 기업의 인력 운영도 유연해져 선진화가 가능하다는 논리다. 그런데 파견업체 소속이지만 실제 일하는 곳은 달라 사장이 두 명인 까닭에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파견 비정규직 노동자의 열악한 현실은 선진화에 고려되지 않은 듯하다. 노동부가 공개하기를 꺼리는 파견고용 실태 자료를 경향신문이 입수해 살펴봤더니 우려했던 대로였다. 지난해 파견·사용자업체 10곳 중 6곳이 노동관계법을 위반할 정도로 불법이 만연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부에 등록된 업체들의 사정이 이럴 진대 점검에서 누락된 미등록·무허가 업체의 위법 실태가 어떠할지는 짐작이 어렵지 않다. 이러한 위법은 제도의 허점에서 비롯한다.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의 고용유연화 권고로 만들어진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말이 보호법이지 실상은 파견고용을 제도화한 비정규직 확대법에 지나지 않는다. 특히 비정규직법 이후 파견법은 취지와 달리, 기업들이 직접고용 비정규직을 간접고용으로 바꾸는 외주화 꼼수의 수단이 되고 있다. 이랜드·기륭전자 등에서 드러났듯 계약직에서 파견직을 거쳐 해고자가 되는 게 우리사회 비정규직의 예고된 행로인 셈이다.
지난 10년 새 파견노동자 수는 2배로 늘었다. 정부는 고용규제부터 풀고, 기업들이 인건비도 덜 들고 해고도 쉬운 파견 비정규직을 앞다퉈 늘린 결과다. 하지만 황새걸음을 한 고용유연화에 견줘 전제조건인 고용안전망 확충은 뱁새걸음에 불과했다. 노동시장의 ‘유연안전성(flexicurity)’을 선진화라고 한다면, 만연하는 불법을 뻔히 보면서도 고용안정은 안중에도 없이 파견고용을 확대하겠다는 것을 선진화라고 부를 수는 없는 노릇이다. 우리보다 12년 앞서 파견법을 만든 일본을 비롯해 미국과 유럽연합(EU)은 파견 고용을 제한하고 차별을 없애는 노동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다. 사회가 불안해지고 있다는 위기의식에서다. 선진국은 고용안정에 힘을 쏟는데 이 정부는 유연화가 선진화라는 주술(呪術)을 되풀이하고 있다.
2009-05-15, 경향신문
노동부에 등록된 업체들의 사정이 이럴 진대 점검에서 누락된 미등록·무허가 업체의 위법 실태가 어떠할지는 짐작이 어렵지 않다. 이러한 위법은 제도의 허점에서 비롯한다.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의 고용유연화 권고로 만들어진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말이 보호법이지 실상은 파견고용을 제도화한 비정규직 확대법에 지나지 않는다. 특히 비정규직법 이후 파견법은 취지와 달리, 기업들이 직접고용 비정규직을 간접고용으로 바꾸는 외주화 꼼수의 수단이 되고 있다. 이랜드·기륭전자 등에서 드러났듯 계약직에서 파견직을 거쳐 해고자가 되는 게 우리사회 비정규직의 예고된 행로인 셈이다.
지난 10년 새 파견노동자 수는 2배로 늘었다. 정부는 고용규제부터 풀고, 기업들이 인건비도 덜 들고 해고도 쉬운 파견 비정규직을 앞다퉈 늘린 결과다. 하지만 황새걸음을 한 고용유연화에 견줘 전제조건인 고용안전망 확충은 뱁새걸음에 불과했다. 노동시장의 ‘유연안전성(flexicurity)’을 선진화라고 한다면, 만연하는 불법을 뻔히 보면서도 고용안정은 안중에도 없이 파견고용을 확대하겠다는 것을 선진화라고 부를 수는 없는 노릇이다. 우리보다 12년 앞서 파견법을 만든 일본을 비롯해 미국과 유럽연합(EU)은 파견 고용을 제한하고 차별을 없애는 노동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다. 사회가 불안해지고 있다는 위기의식에서다. 선진국은 고용안정에 힘을 쏟는데 이 정부는 유연화가 선진화라는 주술(呪術)을 되풀이하고 있다.
2009-05-15, 경향신문